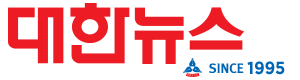‘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눈. 한 번 나빠진 시력을 되돌리긴 힘들지만 안경은 제2의 눈으로 지금까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이야 발전된 기술 덕으로 컴퓨터 보안경, 선글라스, 운동용 고글 등 시력 보정 외에 실용성이 뛰어난 안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안경을 착용했을지 궁금증을 낳기도 한다. 안경은 언제부터 우리 선조와 함께 한 것일까.
안경은 불경죄요!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안경의 시작은 이탈리아 베니스의 유리공들이라고 한다. 1300년에 안경을 지칭하는 용어인 ‘로오디 다 오그리’(Roidi da Ogli)가 베니스에서 최초로 사용됐다는 것. 하지만 누가 안경을 발명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고문서로 기원을 살펴보면 안경은 1280년경에 베니스에서 시작돼 안경 학자나 수도승을 통해 중국 원나라까지 전해졌다고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안경이 처음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1592년)을 전후로 보고 있다. 당시의 안경알은 유리가 아닌 수정을 갈아서 만든 것으로 안경을 처음 본 선조들은 ‘게 눈 같다’며 대놓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한다. 안경은 조선 당시 ‘애채(??)’ 또는 ‘왜납’이라 불렀는데 애체는 중국어에서, 왜납은 페르시아어 ‘애낙(Ainak)’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눈거울’이란 뜻의 ‘안경’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는 거울의 원리에서 안경이 탄생했기 때문.
조선시대에는 궁궐 안에서 안경을 쓰면 불경죄라 하여 유배까지 보냈다고 전해진다. 유교 사회였던 당시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하여 몸에 달린 것을 훼손해서도 또 덧붙여서도 안 되기에 안경을 쓰면 불경죄였던 것. 그렇기에 늘 책을 가까이 해 시력이 안 좋았던 조선의 왕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안경 쓰기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조선의 한 신하는 왕 앞에 안경을 쓴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는 시대. 시력 교정보다는 안경에 관한 예법이 더 컸던 조선 안경잡이들의 기구한 역사다.

집 한 채 값과 맞먹어
조선후기에는 안경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집 한 채 값과 맞먹어 허리춤에 안경집을 매달아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 당시 안경집 중에는 거북이 등껍질이거나 상어 가죽인 어피에 옻칠을 해서 매화꽃 무늬가 돋보이도록 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하지만 고가의 안경을 자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었으니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설 때나 연장자를 만날 때 혹은 높은 신분의 사람 앞에서였다. 안경은 귀한 물건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노인들만 쓰는 것으로, 젊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 그들 앞에서 안경을 착용하면 큰 무례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 따라서 윗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면 ‘불상놈’이라며 욕을 먹기도 했다.
그렇다고 선조들이 안경의 디자인에 관심이 없지도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안경으로 알려진 학봉 김성일의 안경을 살펴보면 아방가르드한 멋이 흐른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을 다녀온 김성일은 안경에 구멍을 내고 실이나 리본을 매달아 고정시키는 ‘실다리 안경’을 착용했다. 이 안경은 거북 등껍질을 이용한 동그란 안경테와 접었다 할 수 있고 정밀한 경첩을 달고 있다. 가벼운 피나무로 만들어진 안경집은 겉만 검은색으로 단정하게 옻칠되어 있고 구름 모양의 안경 코 부분은 청화백자의 목 부분을 닮아 있다. 1889년 미국인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눈에 굉장히 큰 원형의 흑색 수정구 2개를 걸고 다니는데 멋을 내느라 끼고 다니는 것 같다”고 기록을 남겼는데 선조들의 감각이 엿보이기도 한다.
안경의 까다로운 예법은 조선 말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개화가 되고 외교사절단들이 맘 놓고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자 일반 백성들에게도 안경이 보급되었고 궁녀들까지도 안경을 썼다고 한다. 16세기 말에 전래된 안경은 대략 2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민간에 보급될 만큼 인습의 벽은 두꺼웠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