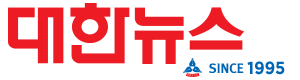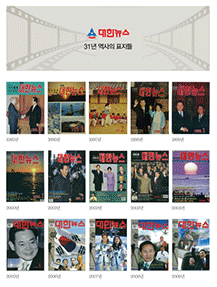[인터넷 대한뉴스]글 박현 기자 | 사진 서연덕 기자
서울 남산 기슭에 위치한 초전섬유·퀼트박물관은 다양한 섬유예술작품이 전시돼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섬유예술사립박물관이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자수, 조각보, 장신구 및 복식과 서양의 전통퀼트작품 및 세계 각국의 인형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8년에 개관한 초전섬유·퀼트박물관은 서울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남산 기슭에 있지만 전통 섬유예술에 관심이 많다면 꼭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한 곳이다. 국내외의 여러 가지 자수와 보, 장신구 및 퀼트 작품들이 전시돼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전시품을 하나씩 눈여겨보면서 장인의 섬세한 솜씨와 기교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이 박물관의 김순희(82) 관장은 사라져가는 한국전통 조각보 기법의 전승과 한국섬유예술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자신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개관했으며 현재 1,700여 점의 작품을 교대로 전시하고 있다. 기자는 김순희 관장과 함께 전시품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작품마다의 특색과 박물관 내력 및 행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소재와 문양의 조각보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벽면에 걸린 형형색색의 보 작품들이 한가득 시야에 들어온다. 마치 이곳을 처음 들른 기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하다. 김순희 관장은 “사실 보자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용품으로서 소중한 물건을 싸거나 음식을 덮을 때,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때 포장으로 사용돼왔다”며 “우리 전통 보자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평소에 쓰고 남겨 모아둔 자투리 천을 이용해 예술작품에 가까운 생활소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활습관으로부터 더욱 짜임새를 갖춘 보 작품이 탄생하게 됐다는 게 김 관장의 설명이다.
전시된 보 작품들은 여름에 쓰인 모시, 삼베, 겨울에 사용된 양단, 모본단, 공단, 명주, 그리고 봄·가을에 쓰인 자미사, 갑사, 항라, 숙고사 등 여러 가지 소재로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 계절에 맞는 직물을 그대로 활용해 작품을 만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로 우리 전통의 오방색(황, 적, 청 흑, 백)을 사용했다. 특히 무명과 명주에 쪽물, 치자물, 쑥물 등 다양한 천연염료로 염색한 후 나무, 꽃, 물고기, 학, 봉황, 나비, 풀 등을 수놓아 만든 수보는 바탕색과 반대되는 보색 계열의 실로 수를 놓아 눈에 띄게 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전통 보에서만 볼 수 있는 양식이다.
화려한 꽃문양이 가장 많이 쓰이다가 19세기 후반부터는 강렬하고 대담한 원색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추상적인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그 중 조각보는 궁중에서는 쓰이지 않은 대표적인 민보에 해당된다. 조각보는 크기, 모양, 질감, 명암, 색채 등이 한데 어우러져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그 독보적인 조형감각과 조화로운 색감은 현대의 추상화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이 조각보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으며 폐품 활용이라는 의미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무언의 희망도 함께 내포돼 있다.
김순희 관장은 보 작품과 관련해 “우리 여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조각보의 아름다움은 때로는 서양화가의 그림에서 느끼는 세련됨으로, 때로는 시골 아낙네의 투박한 너그러움으로 감동을 준다”고 평가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MBC(내), 반디앤 루니스, 테크노 마트 프라임 문고를 비롯
전국 지사 및 지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보기 쉬운 뉴스 인터넷대한뉴스(www.idhn.co.kr) -
- 저작권자 인터넷대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