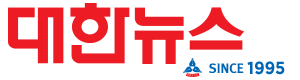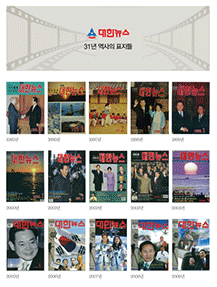새마을운동에 관해 스페인의 아따 기자는 지난 몇 십년간 한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본다고 언급했으며,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한국 정부는 새마을운동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 기사에서는 농촌 경제를 크게 이끈 새마을운동이 다른 나라에도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고 얘기했다. 미국의 제이슨 기자는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 경제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이다. 새마을운동 전부터 한국은 산업부흥을 위해 기업 육성을 시작한 상태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특히 농촌개발에 집중했던 것이 새마을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스티븐 기자는 “새마을운동은 곧 한국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했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이 달라지고 있다. 아프리카 중부 르완다의 경우 한국의 지역개발 모델 새마을운동을 도입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도움을 주고, 선진 농업기술이 전수되면서 열악한 토양은 논으로 개간됐고, 가구 소득도 높아지는 등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불고 있다.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1970년대 한국 전역 약 3만 개 행정 구역에 시멘트를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각 마을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스스로 어떻게 마을을 발전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다. 마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서 현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사회 통제의 수단이기도 했으나 국가 예산의 10%를 확대시키는 등 성공적인 모델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나, 상황이 다르고 1970년대 당시처럼 완벽히 따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스페인의 아따 기자는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도입시키려는 이유는 개발모델을 적용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새마을운동의 아이디어는 도입국의 농부를 교육시키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제이슨 기자는 “한국 사회 안에서 진정한 개선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고, 여성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었다. 새마을 부녀회 5대 부녀운동 실천대회와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이 분명했고, 남성과 여성 간 활동영역의 균형이 잡혔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들은 종종 남성보다 지위가 약하다. 그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스티븐 기자는 “지구촌 새마을운동과 한국의 것 중 다른 점은, 한국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인종이고, 같은 전통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적용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것이라 본다. 르완다 같은 소수 민족 나라의 경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각기 다른 역사와 기후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 한국과 같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Michael Maren의「The Road To Hell」이라는 책을 보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식량 원조가 그들의 지역 경제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국제 원조 기구들은 원조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정말 이끌어낼 수 있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꼬집었다. 캐나다의 스티븐 기자도 “프레드 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에티오피아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기근은 사실 결핍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쟁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또 어떤 일부 국가에선 정부에 충성하지 않으면 식량을 주지 않는다. 어떤 나라가 원조를 받을 때 강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지, 신용이 있는지 논의해야한다. 혹, 원조 전달 과정에서 해당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지, 기근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체크하고 과정을 살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지는 내용에선 농촌진흥청에 방문한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연수생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방문한 이들은 현대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왔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국 농업 발전에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들은 국가별 원조 기구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스페인의 아따 기자는 “스페인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많이 줄였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었고, 실업률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상황이 어려울 경우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 어려워진다. 여전히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유럽연합(EU)이 권하는 수치엔 부족하다. 다른 나라를 소개하자면 독일의 경우 그저 원조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 나라에 방문해서 지역 사회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이슨 기자는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 중 케네디 정부 시절 Peace Corps라는 유명한 원조 기구가 있는데, 대학을 갓 나온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농업 발전과 교육 지원을 했다. 또, USAID가 있는데 피델 카스트로 정권의 가치 규범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기구들의 문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원조를 행할 경우 신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유럽연합은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하며, 이는 국제적인 정체성을 위한 외교수단이기도 하다. 아따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원조자금이 축소되긴 했지만 유럽연합은 원조의 양을 증대하는 것보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송에서는 세계의 빈곤국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향후 개발원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외신 기자들의 거침없는 의견과 참신한 시선은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아리랑 TV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