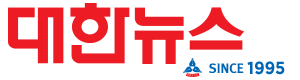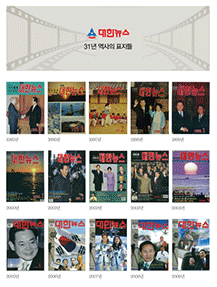[인터넷 대한뉴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40주년이 되었다. 1972년 9월 ‘통한문제연구소’로 개소한 이후 1973년 ‘극동문제연구소’로 개명하여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안보, 북한 연구, 동북아 평화연구, 외교 연구 등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곧 대선이 치러진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대북정책, 한·미 관계와 북핵문제 그리고 북한의 반응 등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동북아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씽크탱크 극동문제연구소의 지난 40년의 업적과 사회공로를 살펴보고 다가올 40년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심층 조명해본다.
냉전 시대 공산권 연구 물꼬 트다
40년 전, 박재규 박사는 미국의 대학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산권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확신 속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에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한국에서의 공산권 연구야말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간파했다. 당시 ‘공산권 연구’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시대였고 지방 사립대학의 부속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에서 북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냉전 시기에 대학 부설연구소라는 아주 특수한 제도로 탄생하였다. 태평로에 있던 광학빌딩의 조그만 사무실, 말이 사무실이지 방 한 칸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염홍철(제3대 극동문제연구소장)대전광역시장과 함께 전화 받는 아가씨 한 사람이 연구소 인원 전부였다.
그 후 고현욱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합류하였다. 1974년 1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첫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북아 지역은 물론,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다. 냉전 시대의 대내·외적 환경에서 모험을 무릅쓰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첫 사업이었다.
세월이 흘러 세계적 냉전이 종식되고 한반도에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어 북한연구에 대한 여건이 이전보다 크게 나아지기 시작했다.
민주화 시대 국제적 학문 연구 교류의 장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과 공산권 연구의 세계적 연구소로 급성장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석학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모여드는 학문 연구 교류의 장이 되었다. 동북아 연구 분야의 세계적 유수 연구기관들과 제휴를 확대하며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15개국 23개소에 이른다.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이래 학계 발전에 공헌 한 점을 살펴보자. 1973년부터 동북아문제 국제학술회의, 1995년부터 통일전략포럼을 현재까지 계속 개최하여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77년 ‘Asian Perspective’ 영문 학술잡지를 발행하여 해외 학계와 국내 학자를 연계하여 동북아연구의 세계화를 대변하고 있다. 1985년 ‘한국과 국제정치’발행을 통해 국내와 국제 정치학 발전에 공헌, 마그마(용암이 분출하기 직전의 모습과 비교해 박사를 막 취득한 학자를 일컫는 표현)제도를 운영하여 젊은 연구자에게 북한 정치 및 국제정치에 관한 논문 발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한국 및 외국인 학자들에게 편리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다수의 외국 대학교수들을 연구소장으로 청빙하여 참신한 연구 계획을 추진했다. 수없이 많은 국제학술회의 개최는 한국 사회과학의 수준과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경남대학교를 대표하는 교책 연구기관일 뿐만 아니라, 북한 및 통일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씽크탱크’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10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MBC(내), 반디앤 루니스, 테크노 마트 프라임 문고를 비롯
전국 지사 및 지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보기 쉬운 뉴스 인터넷대한뉴스(www.idhn.co.kr) -
- 저작권자 인터넷대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